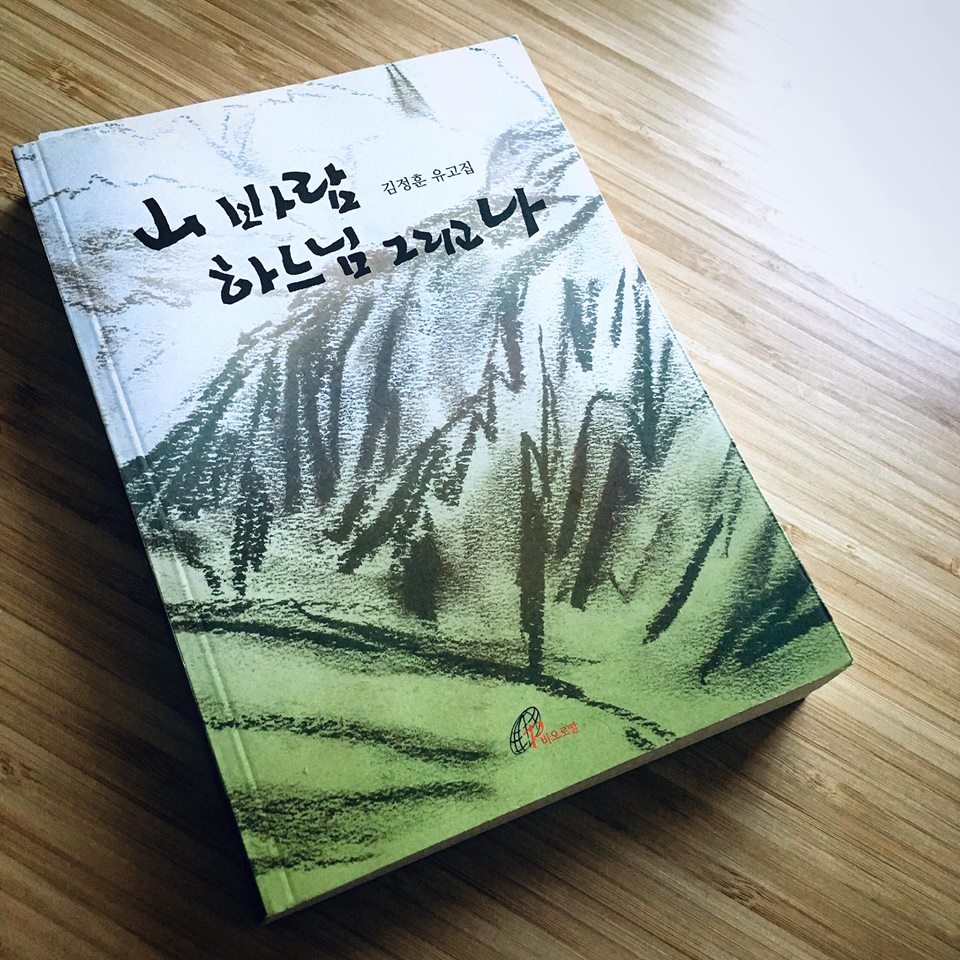
어찌나 몰입이 쉽던지 한달음에 읽을 뻔했다. 허나, 육아는 긴 집중을 허락치 않았다. 뭐- 어쨌거나 여정을 마쳤다. 내가 나기 전 시대의 젊은이지만, 믿음에 시간이 무슨 소용! 지난 20대 시절의 씨름하던 여정의 일기를 보는 느낌이라 더 정겹고 가깝게 공감하며 또 탄식하며, 한수 배우며 그렇게 완독했다. 여정이란 표현이 정확하다. 이것은 여정이었다. 짧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 수다 떨며 걷는 여정.
이기헌 주교님과 동기라니 살아 계셨으면 감히 말도 못 걸었을 분이었겠지만, 이 흔적 속의 김 부제는 나보다 조금 어린 또래 친구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더 정겹다. 과거로 돌아가 20대 시절을 함께 보냈다면, 추운 날 담배 한대 같이 피우며 속에 든 덩어리들에 대한 공감을 깊게 나눴을텐데. 좋은 친구처럼 정겨웠을 모습을 상상하며 읽다 보니 책을 덮을 때 아쉬움도 컸다.
언젠가, 그분의 무덤 앞에서 인사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고마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