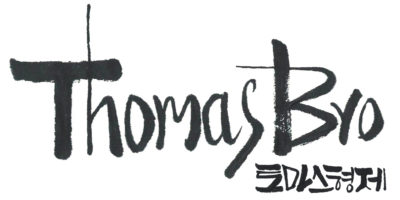순교자 성월이 끝났덴다. 솔직한 심정은… 시작도 안했는데 끝나버린 느낌이다. 아무래도 한국 땅에 있지 않은 탓에 (게다가 순교 흔적을 찾기 어려운 미국이다보니) 순교자 성월이 먼 나라 일처럼만 느껴진 것도 사실이다. 순교자 성월이 끝났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에 한국의 귀한 신앙 선조들을 생각하는데, 쌩뚱 맞게도 순교자도 아닌 분이 떠올라 그분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신부’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그늘에 살포시 가리워진 느낌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한국의 두번째 천주교 사제이자 순교가 아닌 증거자로서 가경자에 선포된 유일한 분, 최양업 토마스 사제가 바로 그분이다.
지금이라면 한참 중2병을 앓을 시기, 아이돌에 열광하거나 연습생이 되길 꿈 꿀 나이인, 열다섯의 나이에 사제가 되기 위해 친구 둘과 마카오로 떠나간 그 여정은 예상했겠지만 순탄치 않았다. 셋 중에 가장 영리하고 믿음이 굳건했던 최방제 프란치스코는 열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허약한 몸에 잦은 병치레를 겪었지만 보다 먼저 사제품을 받고 고국으로 들어간 김대건 안드레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너무나 위험했던 조선의 상황에 천주교가 몰락하듯 기울고 있었던 시점에 홀로 남은 그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열 다섯에 떠난 그는 서른이 다 될 무렵에야 사제품을 받고 조국으로 겨우 돌아온다. 그 뒤 장차 약 12년을 오직 두 발로 전국을 걸어다니며 사목활동을 펼쳤다. 매년 2800km를 걸었다고 하니, 왜 그를 ‘땀의 순교자’라 부르는지 알 법도 하다. 현대에는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길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다. 조선의 사제가 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미 죽음은 예견되어 있고 순교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음이 분명할 텐데, 순교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조차도 ‘피해야만’ 했던 목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마흔살의 젊은 나이에 과로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어딘가에서 읽었던 글귀가 생각난다. “순교를 하는 것보다, 매일을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삶일 것이다.”
부모는 물론 친구와 친척, 많은 동료들이 순교로 주님을 증거할 때 따라가지 못하고 피해다녀야만 했던 그의 삶은 어쩌면 순교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지 모른다. 물론 순교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에 있어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기꺼이 또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 고통의 영광 마저 내려두고 피해야 했던 더한 고통이 예수님의 수난을 순교가 아닌 또 다른 형태로 살아낸 것이기에, 그 고통은 또 다른 영광스러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조선에 이은 한국 천주교회가, 그 피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겠지…
왜 그렇게까지 하며 살았을까. 돈을 주는 것도, 벼슬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목숨을 지킴과 동시에 잃어가면서 까지 걷고 걷고 걷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에게 심어진, 거룩한 부르심이자 은총이고,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잘 살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 살아야한다는 생각만 남는다. 그냥 살았어도 잘 살아야 마땅하지만, 주님을 더 열열히 따르겠다고 나선 이 마당에 더욱 잘 살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배론성지를 냉큼 달려가 넓은 성지 땅을 거닐며 많은 묵상을 했을텐데, 아쉽다.
+천주여, 당신이 조선 땅을 사랑하여 거룩한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의 피와 땀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당신을 증거한 이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피와 땀을 아까워 하지 않으며 당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당신 종 최양업 신부의 삶이 온 교회의 모범으로서 선포되게 하소서.